발자국 소네트
김휼
그때 나는 뜨거워지고 있었다
무대는 들끓었고 노래는 완벽했다
마지막 후렴이 시작될 즈음
한 가닥 빛이 나를 뚫고 지나갔다
주저앉아 구멍 난 몸과
사라지는 빛의 꼬리를 바라보았다
무작정 빛을 따라갔다
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
북서풍이 부는 거리를 종일을 걸었다
부르튼 발에 꽈리처럼 물집이 부풀어 올랐다
허방 같은 물컹한 집을 터트리자
고여 있던 무성음들이 쏟아져 나왔다
울음이 다 빠져나간 폐허의 집
한 점 메아리도 남지 않은 헌 집
한참을 웅크리고 앉아
멈추어도 흔들리는 것들을 생각했다
全 생을 걸고 바라보던 태양 아래서
까맣게 박힌 울음의 씨앗을 묻고
해바라기는 늙어가고 있었다
바람은 다른 계절을 품고 불어왔다
목마름쯤은 들숨으로 받아내는 순전한 그와
그림자를 잇는 길에 몸을 맡겼다
▶돌아보면, 긴 시간을 걸어왔다. 바닥에 찍힌 발자국마다 무늬가 다름을 보게 된다.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꽃잎 같은 걸음으로 걸을 때도 있었고 납덩이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때도 있었다. 홀로 걸어야 할 때도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몸을 기대며 걸을 때도 있었다. 어느 날인가,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한 가닥 빛이 내 몸을 뚫고 지나갔다. 나는 홀린 듯 빛을 따라 갔다. 걷고 또 걷고 빛을 따라 걸었다. 걷다 밤이면 잠시 허름한 곳에서 몸을 쉬었다. 한 점 메아리도 남지 않은 나의 헌 집, 내가 머문 나의 집에서 나를 보았다. 멈추어도 흔들리는 것들을 생각하며 밥을 보내고 아침을 맞았다. 그리고 다시 길을 나선다. 까만 울음의 씨앗을 묻고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아직도 가야 할 여정이 남아있는 편도의 길에서 나는 나의 빛을 바라본다. 그리고 길에 몸을 맡긴다.
|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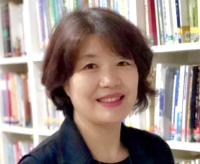 |
|
| ⓒ GBN 경북방송 |
|
▶약력
한국기독공보 신춘문예와 《열린시학》으로 등단
여수해양문학상, 목포문학상 본상, 열린시학상 수상
2021 광주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수혜
시집 『그곳엔 두 개의 달이 있었다』
|
 회원가입
회원가입